“부산은 개방·혼종으로 대표되는 한국 도시민속 발원지”
- 가
한국해양대 김정하 명예교수
한국의 도시민속 분석 책 출간
민족·전통 중심 추상 접근 탈피
역사 상황 속 도시민 실상 천착
부산은 글로컬리즘의 전형 도시
 부산 영도구 대평동 선박수리업소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깡깡이아지매 작업 모습. 최민식 사진작가 유족 제공
부산 영도구 대평동 선박수리업소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깡깡이아지매 작업 모습. 최민식 사진작가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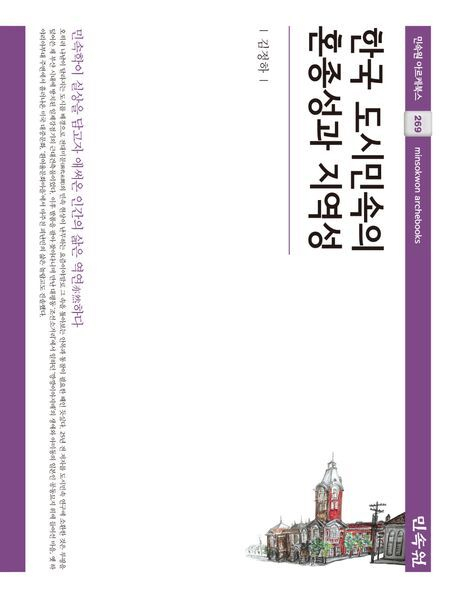
“나날이 달라지는 도시를 배경으로 전대미문의 민속 현상이 난무하는 요즘이다. 그 속을 톺아보는 안목과 통찰이 꼭 필요하다. 25년 전 부산 시내에 방치된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을 보며 도시민속 연구의 길로 빠져들었다. 부산은 개방과 혼종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나름의 도시 민속을 만들고 전했다.”
국립해양대학교에서 28년간 재직하며 동아시아사를 비롯해 도시민속, 근현대지역사, 도시 재생과 지역 문화유산 보존 등을 연구했던 김정하 교수. 현재 해양대 명예교수인 그는 최근 <한국 도시민속의 혼종성과 지역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을 쓴 목적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목은 한국 도시민속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책의 대부분은 부산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다. 김 교수는 이에 관해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1922년 소설 <만세전>을 쓴 염상섭이 ‘부산의 운명이 조선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도시민속 분야에서 앞서 문장을 해석하자면, 부산의 도시 민속이 곧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도시민속을 ‘민족’과 ‘전통’이라는 추상과 관념에 의존해서는 구태의연하고 박제된 사례밖에 없다. 그보다 근현대 도시의 평범한 도시민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한 일상과 노동, 신앙, 전설, 대중문화 등 살아있는 사례를 파고들어야 현대민속이라고 불리는 도시민속 면모를 밝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은 한국의 도시민속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확하다.”
김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어조로 ‘부산이 한국 도시민속의 발원지’라고 표현했다.
근대 건축물이 산재한 원도심이나 동래, 일제 강점기 마사와 우사에서 6·25 전란기 피난민이 삶을 꾸린 범일동과 우암동,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하꼬방을 지은 아미동, 대평동 선박수리업소에서 헌신적 생애를 펼쳐보인 ‘깡깡이아지매’, 하얄리아부대에서 흘러나온 미국 대중음악이 광복동의 음악다방과 감상실을 통해 ‘7080음악’으로 태어난 걸 보면 도시 민속 발원지가 부산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책은 1부 ‘타자화를 극복한 혼종성’과 2부 ‘표준화를 극복한 지역성’이라는 제목 아래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타자화’는 서구적 근대를 먼저 받아들인 일제나 해방 후의 국민국가가 식민지와 지방을 후진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발명한 논리이자 근대화를 추구한 명분이었음을 비판한다. 권력이나 권위, 지식을 앞세운 식민 당국이나 중앙정부, 전문가가 지역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재단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논리가 ‘표준화’이며 지역민의 삶이 도외시되었음을 비판한다.
개항기 부산의 도시민속을 ‘생선회’나 ‘어묵’처럼 외래민속이 그대로 수용된 경우와 ‘장례’처럼 외래민속에 의해 전래민속이 변형된 경우,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 등 새롭게 창출된 경우로 분류한다. 특히 부산의 민간 조직 ‘동래기영회’와 ‘동래권번’이 근대 교육을 받아들이고자 육영사업을 펼치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저자는 주위의 편견과 질시에도 가정을 지키며 원양어업,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대평동 조선소거리 깡깡이 아지매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 도시재생의 모델이 된 ‘깡깡이예술문화마을사업’까지 연결됐다.
부산의 개방성, 혼종성이야말로 한국 도시민속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부산은 결국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구현하는 글로컬리즘을 가장 잘 진행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김효정 기자 teres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