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부산에는 없는… 누군가에게 '심장'이 되는 페스티벌
- 가
김형 경제부 유통관광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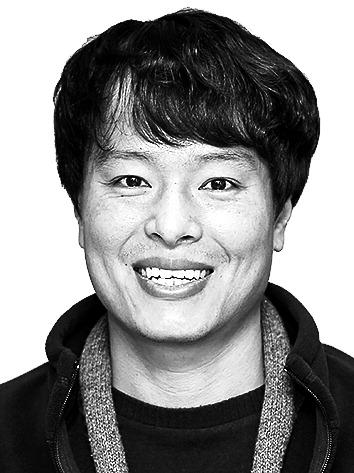
무작정 짐을 쌌다. 반드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로 꼽히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당시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글래스톤베리 록 페스티벌을 동경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나 역시 하루 종일 록 음악만 듣고 살았던 ‘록덕후’였으니. 글래스톤베리 록 페스티벌은 언제나 나의 소망 목록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었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한마디로 ‘광란’이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5일 내내 비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고 심지어 폭우까지 쏟아졌다. 공연장이 농지이다 보니 금세 진흙탕이 돼버렸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더 신이 났다. 비 온다고 집이나 호텔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
당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모인 사람만 20만 명.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수만 명이 비에 온 몸이 젖은 채 폭우만큼이나 강렬한 기타 선율에 맞춰 ‘헤드뱅잉’했다. 온 몸이 진흙으로 칠갑돼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거나 부둥켜안고 음악 소리에 몸을 내맡겼다.
이곳에서는 나이도, 인종도, 문화도 구분 짓지 않았다. 그 선이나 틀이 없다 보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음악과 진흙탕에 그 선과 틀은 묻혔다.
‘자본, 권력 그리고 힘 있는 문화가 구별지어 놓은 선과 틀을 없애자’는 것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만의 ‘가치’였다. 그 가치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뜨거운 ‘심장’이다.
이 덕분에 나는 개인적으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영국 서밋시카운티라는 아주 작은 동네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내 심장을 달아준 곳이잖아. 어디 나뿐일까. 그동안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다녀간 사람만 수백만 명. 현재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매년 모이는 사람은 평균 20만 명. 또 한 번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가보길 원하는 덕후 수백 만 명이 작은 동네 서밋시카운티를 기억하거나 동경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추억과 동경은 곧 도시 경쟁력 강화와 막대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경제적 효과는 1조 원대. 이 페스트벌이 영국 서밋시카운티를 먹여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작은 촌동네 서밋시카운티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부산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을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부산은 관광명소, 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환경이 서밋시카운티보다 훨씬 낫지만 누군가의 영원한 ‘추억’이나 뜨거운 ‘심장’이 될 만한 페스티벌 하나 없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춘 부산에는 예산만 쏟아 부은 일회성 행사가 전부이다. ‘부산다운’, ‘부산만의’ 가치를 담은 행사는 없다. 한번 보고 나면 끝이다. 화장실 다녀오면 잊듯이. 이런 행사들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심장이 될 수 있을까?
다행히 최근 부산에서도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WSX)와 유사한 ‘메가 스마트 뮤직 페스티벌’이 논의되고 있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스티벌에 어떤 가치를 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메가 스마트 뮤직 페스티벌에 어떤 가치가 담길지 무척 흥분된다. moo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