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1982년과 2021년의 부산
- 가
김마선 사회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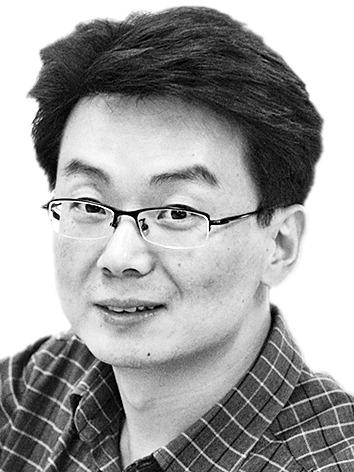
기대와 걱정, 그리고 추위가 뒤섞인 밤이었다. 동네 어귀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닥불 너머로 따뜻한 걱정과 격려가 오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에서 불빛이 깜빡거렸다. 비포장길을 따라 뒤뚱거리며 올라왔다. 아랫동네 이삿짐을 먼저 실은 트럭이었다. 이불 보따리를 짐칸에 싣고 우리 가족은 몸을 실었다. 보따리 속에는 내 검정고무신도 있었다. 그렇게 도착했던 곳. 바로 부산이었다. 1982년 2월의 이야기다.
한때 부산은 ‘서울’이었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먹고살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부산은 엄마처럼 그들과 그 꿈을 품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에 그러했고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그러했다. 너도나도 모여드는 통에 비록 몸살을 앓을지언정 반도 끝자락의 도시는 주린 이들에게 젖을 물렸다.
지역 대학들 역대급 미달 신음
근본 원인인 ‘지역 엑소더스’
지역 붕괴 신호탄, 국가 경쟁력 하락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에도 이로워
메가시티, 신공항, 북항재개발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시켜야
2021년 4월. 통계청이 올 1분기 국내 인구이동동향을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부산에서 4701명이 순유출됐다. 전출한 사람이 전입한 사람보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4232명, 그러니까 열에 아홉이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설상가상 출생률은 전국 꼴찌고, 사망률은 출생률을 앞섰다. 사람은 떠나고, 태어나는 아이는 적은 부산. 객지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늙은 어머니와 같은 전국 2대 도시의 쓸쓸한 자화상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지역 대학들이다. 올해가 특히 심하다. 2021학년도 입시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이 정원을 못 채웠다. 부산시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부산 지역 15개 4년제 대학은 4639명을 추가모집했다. 지난해보다 3373명이 늘었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미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여파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동부산대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신라대도 무용·음악학과 폐과를 놓고 시끄럽고, 청소노동자를 해고해 갈등이 이어진다. 소리 소문 없이 환경공학과를 없앤 데가 확인된 곳만 3군데다. 지난주 만난 부산의 교수는 이렇게 귀띔했다. “요새 교수들 심정이 자기가 나가기 전까지만 버텨 달라는 것이다.” 위기 의식은 대학들 간의 통합을 채찍질하기도 한다. 지난달 19일 부산대와 부산교대 총장이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간 합종연횡이 이어질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학령인구의 감소 탓이라지만 본질은 ‘지역 엑소더스’다.
과거 부산은 합판, 신발로 먹고살았다.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스마트폰과 견줄 만하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산업구조개편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관광·서비스 같은 소비산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부산의 현실은 곧 ‘지역’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역은 뭉쳐야 한다. 항아리 속의 게들처럼 싸워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목할 만하다. 올 2월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신공항도 도약의 계기다. 북항은 재개발 중이다. 부산의 ‘빅 픽처’를 다시 그려야 할 때다.
지난달 8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했다. 그는 부산을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학 문제를 대학 울타리 주위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 지역 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임을 깨닫고 더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기술’이 아닌 정치력과 혁신 의지다. 임기는 사실상 1년 남았다.
대학 위기를 흔히 ‘벚꽃엔딩’이라고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부산과 광주에서 교육감과 대학총장들이 만나 인구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 대탈출 앞에서 영호남이 동병상련이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보면 여전히 서울 지역 대학들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렸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들이 737명을 줄인 것과 대비됐다. 교육부가 나서 전체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수도권 총량규제와 같은 것도 대학에 적용할 만하다.
지역이 약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기 마련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도 이롭다. 어떤 자식은 고도비만이고, 어떤 자식은 배를 곯아서야 되겠는가. 코로나19도 ‘뭉치면 죽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지 않은가. 태어난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사는 것. 2000년대생 부산 토박이인 내 자식들에게 주고픈 선물이다. 적어도 그들이 원한다면 말이다.
여담. 40년 전 부산 올 때 가져왔던 고무신은 며칠 뒤 버렸다.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는 나 말고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신발공장이었으니. m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