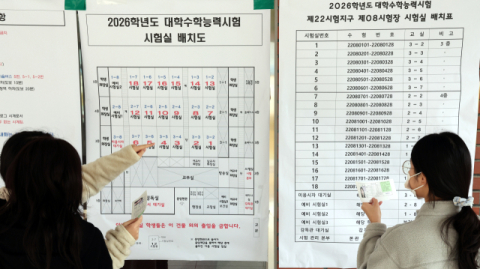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11.14 (금)- 1‘부산 신흥 관문’ 부전역 일대 노점 정비 완료… ‘맞이길’ 조성 속도
- 2GM, 한국서 사실상 철수?… 직영서비스센터 모두 매각
- 3보이스피싱 당했다던 20대, 알고보니 도박 중독자
- 4[단독]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당시 근무자 3명이 500명 순찰
- 5‘빛의 다리’ 광안대교, 12년 만에 새 옷 입었다
- 6광안리~수영강~해운대 ‘부산해상관광택시’ 내년에 뜬다
- 7해양수산부 연내 이전 가시화, 부산 부동산 시장도 ‘들썩’
- 8'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원심 판결 파기
- 9“졸속 매각 안돼” 여야 압박에 한 발 물러선 SK오션플랜트
- 10경남도청 ‘주 4.5일 근무제’ 도입한다

4·3사건 70주년, 제주를 주목한 책 부산서 잇단 출간
- 가

1만 4000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제주 4·3사건 발발 70년이 된 올해를 맞아 제주에 주목한 책이 부산서 잇따라 출간됐다.
비평 전문 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사진 왼쪽·오문비) 108호는 제주 4·3사건을 정면으로 다뤘다. 윤여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남로당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밀항해 재일조선인이 된 김시종의 자서전을 시작으로 '4·3 사건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고 씨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억, 다큐멘터리 '용왕궁의 기억'을 제작 중인 김임만 감독의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제주 4·3 사건에 입체적으로 다가간다. 하상일(동의대 교수) 문학평론가는 재일 조선인 1세이자 제주 4·3사건을 문학적 원체험으로 삼아 작품활동을 펼쳐온 김석범의 기념비적인 저작 '화산도'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분단 모순을 극복하는 역사의 정명을 되찾는 문학적 실천'을 발견한다. 강정마을 주민이자 문화활동가인 엄문희 씨는 '강정은 4·3이다'를 통해 해군기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4·3이 재현됐음을 통찰해낸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양순주 문학평론가는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부모의 고향 제주도로 이주한 재일 조선인 2세 김창생 작가의 에세이집 <제주도의 흙이 된다는 것>(사진 오른쪽·전망)을 번역 출간했다. 연극 공연을 위해 조상의 고향 제주도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고향행이 무산된 김철의 씨 이야기뿐 아니라 '귀향' 등 영화를 통해 본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영화 '물숨' 등을 통한 제주도 사람에 대한 억압의 역사에 대한 성찰, 제주 난개발에 온몸으로 항거한 양용찬 열사 이야기, 강정 문제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재일 조선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역시 되새겨볼 대목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