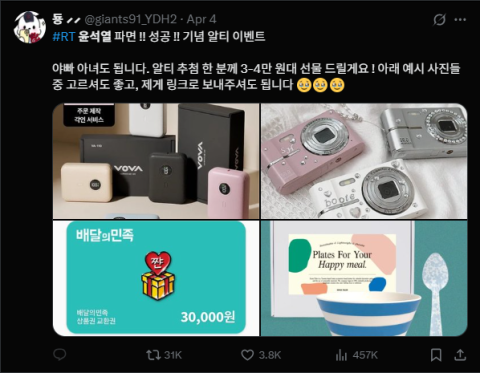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4.08 (화)- 1"사람 죽여 가둬놨다" 대전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 2[인터뷰] 돌아온 변광용 거제시장 “시민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집중”
- 3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출마 막판 고심
- 4분담금 폭탄 시름 깊은 삼익비치 결국 99층 ‘특별건축구역’ 포기
- 5민주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이완규는 내란 공범 의심 인물"
- 6늘어난 분담금·공사비·공사기간… 삼익비치 조합원 마음 바꿨다
- 7야산서 발견된 시신…일면식 없는 50대 살해 후 유기한 노래방 종업원, 혐의 인정
- 8재혼 2달 뒤 숨진 80대 남편 통장서 56억 인출한 60대, 사기 무혐의…왜?
- 9부산 도시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불… 인명피해 없어
- 10"업혀, 할매" 산불 때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인문산책] 권력자의 성품
- 가
/곽차섭 부산대 사학과 교수

권력자는 어떤 성품(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어떤 성품이 권력을 얻고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칭송하거나 비난받게끔 하는 것을 논한 <군주론> 15장에서 권력자의 성품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는 대략 11가지 인간 성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후하다/인색하다, 베푼다/탐욕스럽다, 잔혹하다/자비롭다, 불충하다/충실하다, 유약하고 소심하다/대담하고 기백이 있다, 인간적이다/오만하다, 음탕하다/정숙하다, 성실하다/교활하다, 딱딱하다/무르다, 무겁다/가볍다, 신심이 깊다/의심이 많다.
각 쌍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어떤 한 기준에서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라 불리는 것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어떤 군주가 선하다고 하는 성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칭송해 마지않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선한 성품들로 인해 자신이 파멸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정치 혹은 권력의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할 때 자신만 선함에 집착한다면 경쟁에서 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이 문제가 될 때에는 악한 성품으로 인한 악명쯤에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시대의 성격에 맞추면 흥한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조언 할까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냉혹하고 종종 부도덕하게까지 보이는 이러한 언명은,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의 장에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이 전도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권력의 획득과 보존을 지상 목표로 삼는 군주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사물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베리타 에페투알레', 즉 실제적 진실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는 선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종종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이 그 밑에 깔려 있다.
<군주론> 25장에서 마키아벨리는 다시, 자신의 비르투(능력)와 포르투나(외적 조건) 사이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인간 성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어떤 군주들은 서로 거의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도, 왜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는 것인가? 또한 스스로의 성품을 전혀 바꾸지 않은 한 군주가 왜 오늘은 번영하다가 내일은 몰락하는 것인가? 성품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의문에 답하자면, 자신이 지닌 비르투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성품과 행동 방식을 시대의 성격에 맞추는 군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군주는 망한다는 것이다.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람의 방향을 잘 감지하여 그것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성품(들)을 타고나게 마련이지만, 그중에서도 권력자(혹은 성공을 원하는 자)에게 좀 더 적절한 성품은 신중한 쪽보다는 격정적인 쪽이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견해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만사에 격정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다. 시대의 흐름이 신중함을 요구할 때 격정적 성품만을 고집하면 당연히 패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이것저것 재며 결정을 망설이다가는 꼭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니, 기백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성공의 길에 더 가깝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장 싫어했다. 신중함이란 위기의 순간에는 우유부단함에 다름 아니니, 마키아벨리의 성품론은 곧 위기의 리더십에 대한 제언이라 할 만하다. 바야흐로 대통령의 자리를 향한 단거리 경주가 막 시작되었다. 대조적인 성품의 소유자인 각 후보자들에게 마키아벨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었을까.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