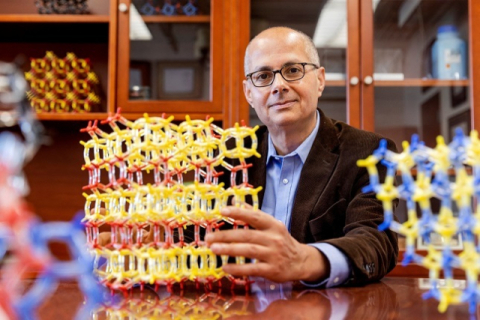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10.09 (목)- 1부산 관광지에 난립한 ‘정치 현수막’ 금지된다
- 2부산 영도구 노래방서 화재, 1명 숨지고 6명 부상
- 3부산 동서고가도로서 택시 미끄러져 8중 추돌… 3명 부상
- 4희극인 정세협 사망…개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
- 5부산 남구 고등학교에서 불… 인명 피해 없어
- 6‘논란의 냉부해’ 이 대통령이 밝힌 출연 이유…“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
- 7금값, 사상 첫 4000달러 눈앞…올해 51% 상승 질주
- 8이재명 대통령, 추석 맞아 부모 선영 참배…"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 9‘호황’ 조선3사 작년 신규 채용 4000명… 한화오션 최다
- 10병원 반복 입원해 보험금 2억여 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아침향기] 딸을 보내고
- 가
/정영선 소설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딸은 결국 외국으로 나갔다. 졸업하고 취직을 못 해 쩔쩔매는 딸에게 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는데 딸아이도 방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는지 그러자고 했다. 보름 동안 있을 민박집을 정한 것과 6개월간 그 나라 말을 공부할 대학을 정한 것 외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 학비가 싸거나 없는 편이라고 하니 그 걱정은 덜었고 생활비는 적응하면 알바를 구해 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소심한 딸아이는 두려운지 몇 번이나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망설임을 모르는 척했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 원룸을 나섰을 때는 날이 새기 전이었다. 떡국이라도 끓여 먹고 출발하려고 했지만 물 한 잔도 못 먹고 나선 길이었다. 허리까지 오는 이민가방의 바퀴 소리가 좁은 원룸촌 골목을 울렸지만 너무 무거워 들 수도 없었다.
딸아이 먼 이역 유학 떠나던 날
공항서 아침도 못 먹고 헤어져
어느 식당서 정성껏 차린 밥 먹고
'누가 그런 밥상 차려 줄까' 상념
공항은 방학 때보다 한가해 짐을 부치고 나니 출발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다. 밥을 먹기는 어중간해서 빵을 먹자고 했더니 딸은 속이 불편하다며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어제 저녁도 햄버거 하나로 때운 게 생각나 딸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지만 너무 긴장한 얼굴이라 한마디 더 하기도 조심스러웠다. 뜨거운 커피 생각이 났지만 혼자 마실 수도 없어 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아까웠는데 딸이 이제 들어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을 보내고 공항철도를 타고 돌아와 남은 짐을 정리했다. 원래 버리려고 했던 밥그릇이며 숟가락, 커피 잔과 주방 도구, 먹으려고 했던 가래떡 썬 것까지 챙겨 들었다. 주인에게 방 열쇠를 반납하고 돌아서니 세 시가 넘었다. 마음은 착잡했지만 딸아이가 가고 있을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밥을 먹기로 했다. 아니 밥을 먹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몇 번 갔던 밥집 문이 닫혀 작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퇴락한 작은 공장 사이에 간판도 없는 밥집이 몇 군데 있었다. 그중 한 곳의 문을 열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돌솥비빔밥을 주문하고 멍하니 앉아 주방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주머니 세 분이 아직 내리지 않는 달걀값 걱정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저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곧 한 아주머니가 낡은 양은쟁반에 밑반찬을 내왔다. 김치, 미역무침, 버섯볶음 등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는데 나는 놀라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웃음을 베어 문 듯한 아주머니가 귀한 손님이라도 맞는 듯 너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기 때문이었다. 뜨거운 비빔밥 뚝배기를 내 앞에 조심스럽게 두고는 많이 드시라고 인사까지 건넸다. 갑자기 목울대가 시큰해졌다. 어서 먹고 기운 내서 부산 내려가라고 다독이는 것 같았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도록 뚝배기바닥까지 긁어 먹었다. 밥값은 5500원이었다.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귀한 손님처럼 맞이해 주셨던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양손에 종이봉투를 주렁주렁 든 내 모습이 지쳐 보였을까. 며칠 제대로 못 먹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을 것 같다. 그 식당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그 후미진 골목, 퇴락한 공장 사람들일 것이고 아주머니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건 열심히 산 것밖에 더 있을까. 아주머니는 그것이야말로 대접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다.
낯선 나라에서 살게 될 딸아이에게도 누군가가 그런 밥상을 차려 주었으면, 나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딸이 아주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했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 다리가 휘청거렸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