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4.09 (수)- 1재혼 2달 뒤 숨진 80대 남편 통장서 56억 인출한 60대, 사기 무혐의…왜?
- 2[인터뷰] 돌아온 변광용 거제시장 “시민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집중”
- 3야산서 발견된 시신…일면식 없는 50대 살해 후 유기한 노래방 종업원, 혐의 인정
- 4시공 발주 앞둔, 하단녹산선…지반 리스크, 불황 리스크 넘을까
- 5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출마 막판 고심
- 6분담금 폭탄 시름 깊은 삼익비치 결국 99층 ‘특별건축구역’ 포기
- 7민주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이완규는 내란 공범 의심 인물"
- 8늘어난 분담금·공사비·공사기간… 삼익비치 조합원 마음 바꿨다
- 9지역 대학 1000억 국가연구소 잡아라
- 10경북 구미 옥성면서 산불…헬기 12대 투입, 인근 주민 대피문자도

[노트북 단상] 10년 만에 쓰는 속보
- 가
/김마선 사회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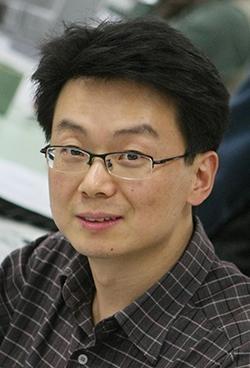
작심하고 걸은 지 12년째다. 뭐든 10년을 하면 도(道)가 트인다고 했던가. 문득 궁금하다. 과연 나는 어떤 도를 텄을까?
2004년 1월 어느 날, 경찰서에서 타 언론사 선배가 들려준 말이 가슴에 팍 꽂혔다. 선배는 대강 기사를 마감하고 짬을 내 아침식사 대신 운동을 하러 가던 참이었다.
내가 물었다. "운동은 왜 합니까?" "밥 안 묵으면 우째 되노?" "죽지예." "운동 안 해도 죽는다." 당시 거구였던 나는 코피를 흘려가며 폭탄주를 마시곤 했다.
그즈음 유행했던 것이 걷기였고, 나도 편승했다. 퇴근하면서 부산진경찰서에 차를 대고 부전시장을 가로질러 40분 거리의 양정 집까지 걸었다. 다음 날 새벽, 반대로 어둠을 가르며 경찰서로 돌아왔다.
내 나름의 전략은 '운동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자'였다. 헬스클럽을 다닌다거나, 퇴근 후 운동장에서 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꾸준히 할 자신이 없었다. 직장인 처지에 일과 후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걷기의 최고 장점은 쉽고,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걷다 보면 심지어 돈을 줍기도 한다.
걷기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내 사연이 부산일보에 실렸다. 그러니 이 글은 10년 만에 쓰는 속보(續報)이기도 하다.
재미가 붙으니 걷기는 출퇴근을 넘어 생활 전반에 침투했다. 심할 때는 하루에 4만 보(10분에 1000보)를 걸었다. 그때는 정말 속보(速步)로, 죽기살기로 걸었다.
계절이 변하고, 부서가 바뀌길 몇 번. 큰길을 피해 개척한 나만의 골목길 루트가 구서동에서 공동어시장까지 이어졌다. 올해 내근 때는 양정에서 서면까지 1시간 걷고 부산진역까지 지하철을 탔다.
걷기 전,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재검진은 필수였다.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재검을 받지 않았다.
처음에 걷기는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만보기(萬步機)도 장만해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했다.
10년이 넘은 지금, 걷기는 '목적'이 됐다. 살이 빠지든 말든, 건강이 유지되든 말든, 느릿하게 걷는 자체가 즐겁다.
10년 새 걷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시민공원 개장도 그중 하나. 이맘때는 단풍이 참 좋다. 전포천과 물고기와 물풀, 나무와 꽃과 함께 걷노라면 출근길이 즐겁기까지 하다.
골목 텃밭에도 가을이 스며들어 그 나름대로 풍성하다. 요즘은 홍시, 모과, 대추, 호박, 탱자, 무, 배추 따위가 볼 만하다.
주위에서 가끔 묻는다. "요새도 걷나?" 그 질문은 내게 "요새도 밥 묵나?"를 묻는 것처럼 들린다. 걷기는 일상이 됐다. 매일 걷다 보니 비슷한 곳에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왠지 아는 사람처럼 반갑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문다. 알파고, 개성공단 폐쇄, 총선, 가덕신공항 무산, 교육부 간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폭염과 전기료 폭탄, 경주 지진, 북한 5차 핵실험, 신고리 5·6호기 허가, 태풍 차바 그리고 최순실게이트. 이 와중(渦中)에도 나는 비교적 평화로웠다. 적어도 걸을 때는. m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