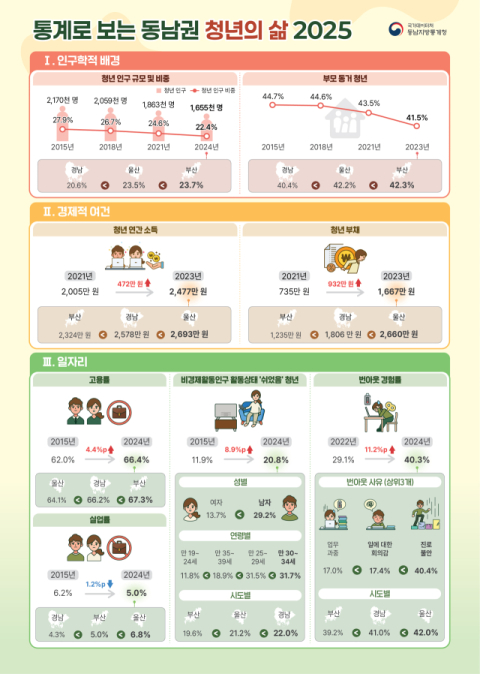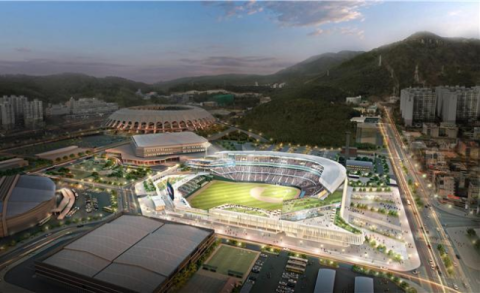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11.01 (토)- 1양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한 페스티벌 열린다
- 2현금투자 10년간 2000억 달러… 한미 관세협상 타결
- 3BNK 회장 선임 앞두고 시작된 정치권 흔들기, 지역선 “개입 말라”
- 4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미 필리조선소서 건조"
- 5박형준 "국토부, 하루라도 빨리 가덕신공항 재입찰해야"
- 6사천서 여성 흉기 살인 후 음독 자살…“채무 관계 추정”
- 7“오늘은 트럼프, 내일은 시진핑” 김해공항 초긴장 모드 [2025 APEC]
- 8[영상] 전재수 “해수부 기능·역할 강화, 1~2달 내 성과 있을 것”
- 9‘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 가열…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생활편익 침해” 반발
- 10한화오션 60조 잭팟 터지나…캐나다 총리 거제사업장 방문

공무원 노조가 나서 "물 관리 일원화"
- 가
선진화된 일본의 물 순환관리
지난해 3월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물순환기본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자치단체별로 물 관리 성숙도에서 차이가 난다. 아직 산업화 시대 하천 형태가 남은 공업도시도 많다. 또 행정 부처별로 분산된 물 관리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표수·지하수 통합 관리하자"
2001년 제안 후 초당파적 호응
2014년 '물순환 기본법'으로 결실
특이하게도 지방자치 공무원 노조가 체계적인 물 관리에 먼저 목소리를 냈다. 2001년 지자체 노동조합연합이 현장의 물순환 관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물기본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초당파적인 정치권 내 개혁위 구성으로 이어졌고, 결국 물순환기본법이 탄생했다.
핵심은 관리의 일원화다. 종전의 부처별 분산된 지표수·지하수 관리를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했다. 빗물부터 지하수까지 물을 생태적으로 순환시키고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정부의 정책으로 수치화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가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본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한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량(국토교통부)과 수질(환경부)의 관리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각각 추진된다. 2007년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진한 하천정화사업 242건 중 150건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일본 물순환기본법에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며 "정책본부는 물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해주고, 지자체는 유역 단위 현장 관리를 통해 현장성이 강조되는 구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과정
-2001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물기본법' 제안
-2003년 전일본수도노동조합 물기본법 수정제안
-2007년 시민포럼 결성
-2008년 물제도개혁국민회의 설치(초당파 국회의원 중심)
-2011년 '물제도 개혁을 요국하는 국민대회'개최
-2012년 물순환기본법 의회상정
-2014년 중의원 만장일치로 물순환기본법 가결
특별취재팀 : 박진국, 김백상, 황석하, 이대진, 장병진 기자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