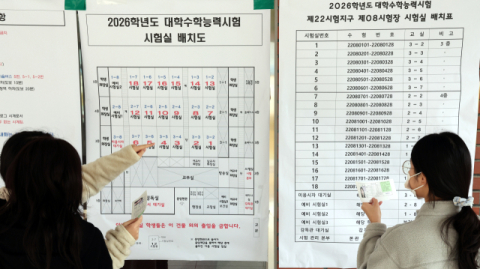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11.14 (금)- 1‘부산 신흥 관문’ 부전역 일대 노점 정비 완료… ‘맞이길’ 조성 속도
- 2GM, 한국서 사실상 철수?… 직영서비스센터 모두 매각
- 3보이스피싱 당했다던 20대, 알고보니 도박 중독자
- 4[단독]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당시 근무자 3명이 500명 순찰
- 5‘빛의 다리’ 광안대교, 12년 만에 새 옷 입었다
- 6광안리~수영강~해운대 ‘부산해상관광택시’ 내년에 뜬다
- 7해양수산부 연내 이전 가시화, 부산 부동산 시장도 ‘들썩’
- 8'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원심 판결 파기
- 9“졸속 매각 안돼” 여야 압박에 한 발 물러선 SK오션플랜트
- 10경남도청 ‘주 4.5일 근무제’ 도입한다

[식물로 세상보기] 2. 솔 없는 산을 상상해보세요
- 가
6천 년 한반도 뿌리내린 '솔' 살려 생태환경 복구를…
 백두대간 육십령의 할미봉 설경. 솔이 드문드문 서 있다. 박중춘 제공
백두대간 육십령의 할미봉 설경. 솔이 드문드문 서 있다. 박중춘 제공솔은 기원전 4천년대부터 한반도에서 살았다고 한다.
지층 화석을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으로 밝혀낸 것이다. 그렇다면, 솔은 6천 년 전 만주 한대(寒帶)식물이 남하하여 한반도 환경에 적응한 수많은 식물종(種) 중 하나이다.
솔은 한반도의 온대기후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한반도의 가을과 겨울은 서늘하고 추운 북방 날씨와 비슷해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여름은 견디긴 힘들었을 성싶다.
솔은 백두대간 바위산 기슭을 새 터전으로 잡았을 법하다. 백두대간의 드센 바람은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했고, 큰 수목이 없는 바위산은 솔이 햇빛을 독차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솔은 백두대간을 타고 번성하였고, 기원전 100년대 삼국시대가 열릴 즈음 한반도 산하는 솔 세상이었을 듯하다. 유적에서 발견된 구들이 증거이다. 구들의 땔감은 화력이 강하면서 오래 타는 솔이 제격이다. 솔이 흔치 않았다면 구들이 가당하기나 했겠는가.
한반도의 솔은 만주에서 왔지만 중국의 송(松)과는 다르다. 송은 중국 황허 동북쪽 산악대지와 산둥성 해안에도 많지만, 자태만 봐도 솔과 확연히 구별된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솔은 새롭게 태어났다.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자란 금강솔과 굽고 뒤틀렸지만 기개를 잃지 않은 적솔을 보면 경외심마저 느끼게 한다. 사진작가 배병우의 솔 연작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솔은 지난 6천 년 간 잇단 전란과 남벌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우리 산하를 지키며 함께해왔다. 그런데 불과 20년 새 명산에서도 솔숲을 보기 어렵다. 태백준령의 국립공원도 온통 활엽수 세상이다. 지난 40년간 지속한 그린벨트 정책과 지구온난화 탓이다. 참나무처럼 빨리 자라는 속성 활엽수가 번성하는 곳에선 솔과 같은 침엽수는 살 수 없다. 침엽수는 강한 햇빛 없이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며, 드센 바람을 맞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여 병·해충에 속수무책이다.
솔의 암이라는 재선충의 창궐도 이 탓이다. 이대로 두면 향후 10년 내 금수강산은 '잡목강산'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 몇몇 종의 속성 활엽수가 득세한 산림은 숲 생태의 다양성을 잃게 되고, 끝내 잡목만 울창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시 숲은 산불을 겪으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수억 년을 나도 원시림은 건강하다. 그린벨트라는 강보(康保)에 싸여 자란 산림은 그렇지 못하다. 산불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녹지보호라는 명분으로 땔감 채취조차 금지한다. 이런 정책이 지나치면 산림을 되레 망친다. 과보호의 폐해는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겉보기만 울창한 대한민국 산림의 생태환경을 되살리려면 솔부터 살려야 한다. 솔은 한반도 생태의 지표(指標)식물이기 때문이다. 먼저, 솔숲 주변의 활엽수를 대거 벌목하고 그 자리에 초지를 조성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들면 솔은 스스로 숲을 이룬다. 그 다음, 보존해야 할 수종을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군락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이때 조성된 초지에 방목축산업을 육성하면, 가축 전염병의 만연과 항생제에 찌든 축산식품 그리고 농촌 하천오염의 주범인 밀식(密植)사육 형 축산산업도 바꿀 수 있다.
최근 산림청이 내놓은 '활엽수의 간벌과 초지 조성 장려'를 골자로 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은 그럴 듯 하지만 너무 안이하다. 예산투입도 민간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도 없는 정책인 데다, 한반도 기온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국토의 70%에 달하는 산지와 산림생태의 근간이 무너지는데도 정부가 이처럼 한가해도 될 일인가! 다음 회(1월 16일 자)의 주제는 '주목'이다.
박중환/'식물의 인문학' 저자
hhogg@hanmail.net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