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틈'] 이웃 위해 할 일
- 가
/김영한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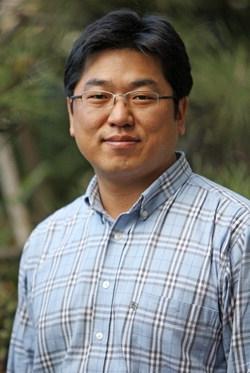
이 판국에 더 보탤 일이 없다 생각했다. 감당 못할 아픔에 위로의 말로는 충분치 못하다 여겼다. 흘러넘치는 슬픔에 그저 가슴만 먹먹했다. 분노 가득한 말을 들을 땐 다른 분노를 보탰다. 그런 날들이었다.
"아빠, 한 명이 더 나왔대." TV 보던 아이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표정한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했는데, 달리 일러 줄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아이는 이번 주말 태권도학원에서 수십 명이 함께 가는 체험학습을 간다. 평소라면 아무 일 없이 보냈을 테다. 하지만 아내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다른 집도 안 보낸다던데…. "가서 친구와 놀고 싶다"는 아이 말에 결국 보내기로 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 대참사는 그렇게 평범하기만 한 일상에도 흘러들고 있다.
칠흑 같은 물속에 어린 청춘들을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끄러운 어른들이지만 제 자식 키워야 하는 부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먼 사람 잡은 자들을 벌 줘야 한다 말해야 하고, 엉뚱한 짓을 벌인 자들을 혼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고통이 이웃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임을 말해 줘야 한다. "한 명 더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보여 주고, 들려줘야 한다. "마음이 아파", 말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과 용기를 나누고자 해야 혼자 넘기에는 너무 높은 슬픔과 아픔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문화 축제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판을 벌일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처구니없이 떠나간 생명을 안타까워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 갈 생명을 위로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무력함과 부끄러움을 잊지 않으려는 애도와 추모도 필요하다.
다행스럽다면 그런 위로와 희망을 찾는 움직임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는 촛불 모임이 매일 저녁 벌어지게 됐다 하고, 부산대 학생들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담는 담벼락도 세웠다 한다. 지역 불교계에서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 온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축소하고 사찰별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무사 생환을 기원하자 결정했다 한다.
아이 손 잡고 가 보려 한다. 큰 아픔이 닥친 이웃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찾아 아이에게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kim01@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