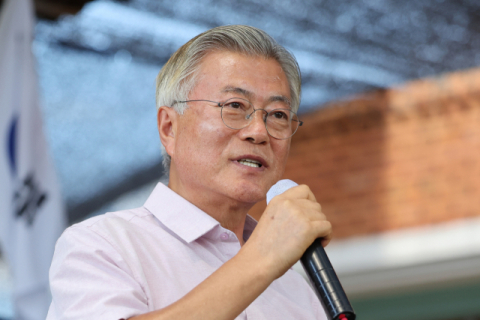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4.18 (금)- 1[단독] 가덕신공항 살리자고 ‘김해공항 폐쇄’ 추진 파장
- 2가덕대교~송정IC 고가 본격화…이달 건설 발주, 2030년 준공
- 3[단독] 서부산권으로 몰리는 데이터센터…부산, 동서간 전력수급 격차 심화
- 4우주항공청 사천에 있는데, ‘대전서 연구개발’ 웬말
- 5최악 땐 활주로 1본만… ‘글로벌 도시 부산’ 신공항 전략 꼬이나
- 6‘만화 전용 도서관’ 연제구에 6월 문 연다
- 7부산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사고 발생… 20대 경찰 사망(종합)
- 8트럼프, ‘부산영사관 포함’ 미국 해외 공관 27곳 폐쇄 검토
- 9에코델타시티 올해 3600여 세대 입주 ‘신도시’ 면모 갖춘다
- 10[2보]부산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사고 발생

인문학 부흥 시대 맞은 대한민국, 그 산실인 대학은 철저히 '비인문학적'
- 가
절망의 인문학 /오창은
 인문학이 호황이다. 하지만 인문학의 산실인 대학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은 비인문학적 관습이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시위하는 장면. 부산일보 DB
인문학이 호황이다. 하지만 인문학의 산실인 대학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은 비인문학적 관습이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시위하는 장면. 부산일보 DB인문학 부흥 시대를 맞고 있다. 인문학적 글쓰기가 유행하고 인문학 강좌가 여기저기서 열린다. 인문학 축제도 여럿 생겼다. 산업화에 대한 반성이든, 또 다른 상업화든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인문학과 문화의 융성을 핵심정책으로 삼는다고 한다. 바야흐로 인문학 부흥시대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생산현장에선 인문학이 목표하는 바처럼 올바른 순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인문학의 생산기지는 대학이다. 대학의 인문학 생산과정이 건강하다면 인문학 또한 건강할 것이다. 생산과정에 억압과 일탈이 끼어들면 불량품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인문학의 산실은 철저히 비인문학적이다.
인문학 비평서 '절망의 인문학'은 인문학의 산실인 대학을 비판한 비평서다. 저자는 인문학 생산현장인 대학, 대학원, 그리고 대학교수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52명의 대학원생, 강사, 교수, 인문학자들과 만난다. 인문학자들과 학문후속세대(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토대다. 한국 인문학이 행해지는 곳의 내밀한 이야기가 가차없이 공개된다.
교수연구실에 방 조교라는 것이 있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머슴이나 하인처럼
부림을 당한다
해외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대학원생을 착취하는
구조 때문이다
 |
| 절망의 인문학 /오창은 |
지식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두뇌한국21(BK21)이 시행됐다. 대학원에 대폭 투자하는 정책으로 2단계 BK21(2006~2012년)에만 2조300억 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 결과 대학원이 대중교육의 장으로 변했다. 소수 사람만이 다니는 베일에 싸인 대학원이 갑작스럽게 열린 것이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 진학한 P 씨. 프로젝트를 다섯 개나 수행하면서 랩실에서 살다시피하며 공부했다. 하지만 그는 담당교수와 의견 충돌을 몇 번 빚었다.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도 연구비 지원이 끊겼다. 그는 아쉽게도 "인생 공부 했다"는 심정으로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인정 투쟁'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인정의 권한을 쥔 사람이 바로 지도교수다. 이것은 패거리주의와 학맥으로 굳어져 학문사회의 저변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
한 대학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대학원 전공시험 채점에 들어간 교수가 채점을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채점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저점을 최고점으로 수정했다. 자신의 전공을 희망한 학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도제식 교육의 병폐를 보여 주는 웃지 못할 사례다.
교수 연구실에서 조교 업무를 하는 방 조교라는 것이 있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머슴이나 하인처럼 부림을 당한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마친 많은 학생이 박사과정을 망설인다. 한국 사회에서 해외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학원생을 착취하는 구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서울대 노문과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대학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 사건으로 얼마 간의 시간강사료가 인상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서울대 독문과 강사가, 2008년엔 서울대 불문과 강사와 건국대 비정규직 교수가 자살을 택했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는 금품 채용 관행, 논문 대필, 불투명한 강사 채용 등을 유서로 남겼다.
2010년 국내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K 씨는 "사회학계만 봤을 때 서울대 출신 남성 연구자이면서 미국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교수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K 씨가 파악한 한국의 학계는 학벌주의, 남성적 가부장제, 미국 유학의 견고한 연대 속에서 재생산된다. 여성이 지방 국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비극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셈이라고 통탄했다.
"한국은 학부와 대학원을 막론하고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기본 교육이 없어요. 인용이 조금만 많아도 제재하는 미국의 연구 논문에 견줘 한국 대학원생의 글은 거의 모자이크 수준입니다. 창조성과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브루클린대에서 공부한 한 연구자의 말이다.
이런 대학 내부의 절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저자는 제도에 의한 절망을 비판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의 지원을 도맡았다. 국가기구의 학문지원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학문제도에 종속되는 경향을 노출시켰다. 이로 인해 기초학문은 양적 팽창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교수는 연구업적을 쌓으려고 대학원생 등 제자들을 그 수단으로 동원하였다. 그릇된 목적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학문은 일반대중들과 연구자들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오창은 지음/이매진/400쪽/1만 8천 원. 이상민 선임기자 yeyun@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