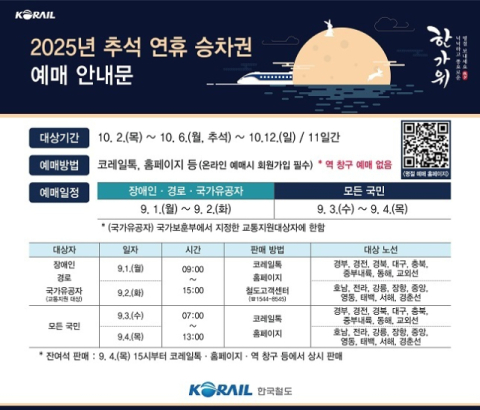[김승일 기자의 쫄깃한 회 스토리] ⑤ 쓰키다시의 탄생
- 가
1970년대 부산 일식 요리사들 '쓰키다시 전쟁'!
 조환영 씨가 1970년대 부산에서 처음 등장한 일식집의 부요리(속칭 쓰키다시)를 재현했다. 왼쪽 사진은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추, 넙치 내장·알 구이, 넙치 껍질초무침, 넙치 뼈살무침.
조환영 씨가 1970년대 부산에서 처음 등장한 일식집의 부요리(속칭 쓰키다시)를 재현했다. 왼쪽 사진은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추, 넙치 내장·알 구이, 넙치 껍질초무침, 넙치 뼈살무침."누가 회 먹으러 가나? 쓰키다시 먹으러 가지!"
예전엔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본말로 '쓰키다시'. 즉, 부요리(곁들이)를 잘 내놓는 횟집이나 일식집이 좋은 식당으로 치부되던 시절의 얘기다.
요즘도 샐러드나 제철 해산물, 주전부리 비슷한 부요리는 넘쳐난다. 젓가락질 한 번 못 해 볼 정도로 가짓수가 많다. 넘치는 부요리가 빈약한 주요리를 압도해도 '공짜' 대접을 받은 느낌이라 관대하게 넘긴다. 회와 함께 발달한 한국의 독특한 부요리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경제개발로 일식집 우후죽순
오너셰프 아이디어 짜내
처음엔 생선 부산물 활용
뼈무침,뼈튀김,껍질초회…
나중엔 별도 구입해 내놓아
상다리 부러져 좋다지만
미리 배불러서야 제 맛 날까
"1970년대 부산의 일식 요리사들이 창업에 나선 뒤 손님 유치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쓰키다시'라는 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부산 일식 조리사계의 원로인 조환영(75) 씨는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외식산업이 성장할 때 우후죽순으로 일식집이 생겨났는데 그 당시 경쟁의 산물로 부요리 문화가 태동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전쟁통인 1951년 부산 서면의 일식당 '일푼리'를 시작으로 온천장 '대성관', 조방앞 '대어' 등에서 60년 가까이 근무하며 일식업계의 부침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원도심이었던 남포동, 중앙동 일대에는 인근의 행정, 법조타운, 부유층이 살던 대신동을 배경으로 일식집들이 번성했는데, 차츰 조방앞과 서면 등 부산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당시 외식산업은 일식이 대세였고, 요즘 표현으로 '오너 셰프'로 독립한 일식요리사들은 치열한 시장경쟁에 맞닥뜨렸는데 그 산물이 '공짜 쓰키다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의욕이 넘치는 요리사들이 앞다퉈 아이디어를 짜냈으니 그 종류는 한정이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진짜 '공짜'인 생선 부산물을 활용한게 주류를 이루다가 차츰 별도로 구입해서 내놓는 식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직접 결정하게 된 '오너 셰프'가 생선회를 떠내고 남은 부산물을 요모조모 활용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건 자연스러웠다. 요컨대 요리사 자신의 인건비를 아낀 결과다.
그래서 탄생한게 살점이 붙은 뼈를 다진 뒤 무쳐 만든 뼈무침(다타키)이나 뼈튀김, 껍질 초간장무침, 내장·알 구이 따위. 이게 한국형 '쓰키다시'의 원조인 셈이다. 일식 코스요리(가이세키)에도 본격 요리인 회에 앞서 계란찜(차완무시)이나 간 마, 계란두부가 나오지만 이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요리였다.
지금은 은퇴한 조 씨에게 원조의 맛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더니 흔쾌히 허락했다. 장소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일식집인 광복로 '삼송초밥'.
당시에도 국민횟감이었던 넙치(광어)의 쓰임새는 많았다. 먼저 넙치 다진뼈살무침. 포를 뜬 뒤 살점이 남아 있는 부드러운 잔뼈를 씹기 좋을 정도까지 칼로 다진 것을 고추장, 참기름, 식초, 다진 마늘을 무쳐서 낸다. 모양새와 맛이 회무침과 비슷하다. 주요리인 회가 나오기 앞서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다.
넙치 껍질 초간장무침도 입안을 상큼하게 만든다. 벗긴 껍질을 뜨거운 물에 데치고 비늘을 제거해서 냉장 숙성해 두었다가 쫄깃하게 씹힐 정도로 꺼칠해지면 미나리와 함께 초간장에 무쳐 낸다. 복어 껍질도 단골 재료.
뼈튀김 역시 막 포를 뜬 뒤 살점이 남아 있는 신선 상태의 것으로 만들었다. 넙치나 도미를 썼는데, 아삭아삭 씹는 맛을 즐기게 해 준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 요리들은 주요리가 나오기 전 허기를 달래거나, 심심풀이 혹은 간단한 술 안주로 인기를 끌었다. 공짜 대접을 받는다는 심리적 포만감도 컸다.
1980년 후반에 들어서는 자제 조달 가능한 생선 부산물의 차별성이 사라졌고 시장에서 사 와서 내놓는 다양화, 원가 대결로 옮아갔다. 제철 해산물인 멍게, 해삼, 문어, 전복, 게를 비롯해서 땅콩, 고구마, 튀김류가 '쓰키다시'의 이름으로 식탁을 점령했다. 그전 일식집에서 단품 메뉴로 돈을 받던 것이 서비스로 탈바꿈한 것이다.
"회를 많이 시키는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도미 머리나 생선 조림을 내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소 눈이나 소 혀 같은 깜짝 메뉴를 개발해 놓고 손님을 유혹했습니다." 손님 끌기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부요리를 염탐하려 경쟁 가게를 기웃거리다 쫓겨나는 촌극도 비일비재했다고.
이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는 풍성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상승작용을 일으킨 부요리 문화는 일식집에서 횟집으로, 일반 주점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손님들은 공짜라는 생각에 '쓰키다시' 더 달라고 아우성이니 식당이 이런 요구를 안 따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요리는 질보다 양, 즉 값싸면서 거나한 상차림이 선호되던 시절의 소산이다. 하지만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 한 끼'의 소식이 권장되고, 맛과 퀄리티에 목을 매는 요즘도 여전히 부요리는 넘친다. 주요리가 나오기 전에 부요리로 배가 부르거나 입맛을 버린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고급 음식인 회에 치른 비용이 무색한 꼴이 된다.
글·사진=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