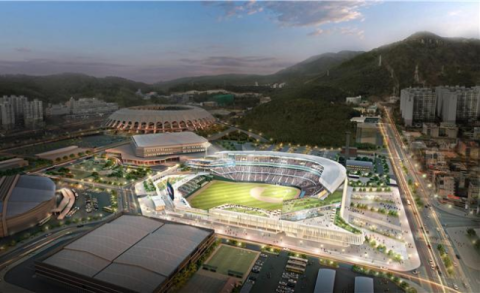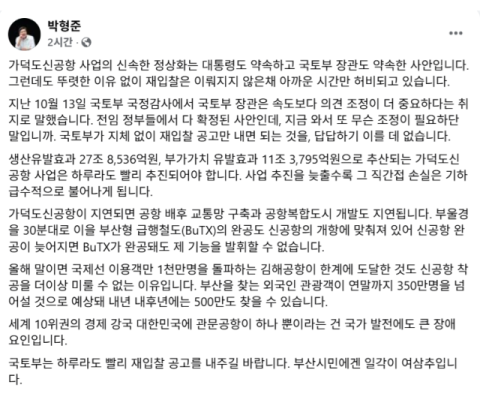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11.01 (토)- 1젠슨황·이재용·정의선 ‘깐부회동’…다 먹고 결제는 누가?
- 2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부산 염원 이뤄졌다
- 3‘판교 사망사고’ 삼성물산, 전국 현장 작업 중단
- 4“누가 봐도 100% 지는 곳” 한동훈에겐 부산이 험지?
- 5수도권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부산 거래량·가격 상승
- 6부산에 가볼 만한 목욕탕은
- 7[영상] 최민희 딸 SNS엔 ‘작년 8월 결혼’… ‘축의금’ 논란 점입가경
- 8G2 정상, 부산에서 만났다… 희토류·관세 등 합의
- 9중구·금정구·북구?… ‘국비 40억 지원’ 국민체육센터 공모 당선 지자체는
- 10양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한 페스티벌 열린다

'철학과 거문고의 만남' 어떨까 몰라
- 가
 '성찰을 통한 자아 되찾기'를 주제로 박정심(왼쪽) 교수가 강연하고 권은영 교수가 이에 걸맞은 거문고 곡을 연주한다. 부산일보 DB
'성찰을 통한 자아 되찾기'를 주제로 박정심(왼쪽) 교수가 강연하고 권은영 교수가 이에 걸맞은 거문고 곡을 연주한다. 부산일보 DB
'거문고와 철학이 만나다.'
거문고로 철학 하기, 또는 철학으로 거문고 하기는 어떨까.
예로부터 학문하는 선비들이 곁에 두던 악기가 거문고다. 가슴에 사무치는 소리를 내는 아쟁과 달리 거문고는 툭 털어 버리는 소리를 낸다. 거문고 소리를 구음으로 옮기면 '둥, 당, 동, 징, 슬기덩'이다. 국악기 가운데 가장 자연과 인간 본성을 닮은 음색을 가졌다. 왕산악이 연주하니 검은 학이 춤을 추었다고 하여 현학금(玄鶴琴)으로도 불린다.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철학자 박정심
내달 1일 부산대 앞 '봄' 색다른 무대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부산대 한국음악과 교수)과 철학자 박정심(부산대 철학과 교수). 거문고는 철학에 깊이를 더해 주고, 철학은 거문고 소리를 호학(好學)의 경지로 끌어올리겠다며 둘이 한 무대에 오른다. 공자는 논어에서 '흥어시 입어례 성어악(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시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예에서 스스로 서며 음악에서 인격을 완성한다)'이라고 했다. 공자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리다.
주제는 ''누구세요'-거문고 타는 권은영과 철학하는 박정심, 그녀들의 '자기(自己)' 이야기'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철학으로, 음악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연주회(또는 강연회)는 박정심 교수가 철학 강의를 한 뒤 권은영 교수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교수는 '반구저기(反求諸己: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음)'를 통해 '각득기소(各得其所:각자 자기 자리에 있음)'를 찾자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공자-다산 정약용-오늘' 3개 시대로 나누고 시대를 막론하고 '제자리 찾기'가 왜 중요한 과제인가를 제시한다. 천하가 혼란에 빠졌던 춘추전국시대, 양난과 당쟁으로 반목하던 정약용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 당대 지식인들은 '반구저기 각득기소'를 추구하였다. 제자리를 찾아 중심을 잡을 때[충(忠)], 사람다운 사람[인(仁)]이 가능하였다. 물질이 모든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오늘의 시대를 살려면 그야말로 '반구저기 각득기소'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대다.
권은영 교수는 '공자-다산 정약용-오늘'에 부치는 거문고 곡을 연주한다.
공자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음악으로 '아름다움과 착함을 다한 음악', '즐거우나 음탕하지 않고 슬퍼도 상심되지 않는 음악(樂而不淫 哀而不像)'을 꼽았다. 수신(修身)과 성찰에 적합한 거문고 곡으로는 정악(正樂) 중 '밑도드리'와 '상령산'만 한 곡이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다산 정약용은 세속적인 음악이라도 그 음악이 연주될 때 서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교감하고 하나 되는 것이 다산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仁)이라고 해석하여 거문고 산조곡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창작곡 거문고 독주곡 '달하 노피곰'과 거문고 피아노 이중주 '꿈속에서'로 오늘을 표현한다.
이번 무대는 부산대 앞 문화공간 '봄'에서 열린다. 부산대 인문학자들이 만든 '부산대 대학문화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이 위원회는 날로 상업화되는 대학 주변의 문화를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최근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첫 실천이 이번 철학과 거문고의 만남이다.
▶누구세요?=5월 1일 오후 7시 문화공간 봄. 051-714-6909. 이상민 선임기자 yey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